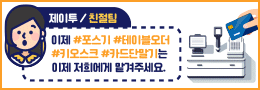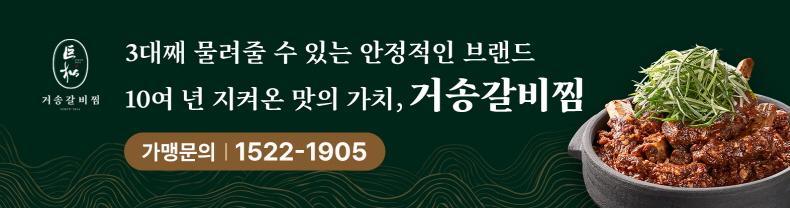경남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품은 이 천년 고찰의 한켠에서, 오늘도 나무를 마주한 장인의 손끝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해인사 판각학교에서 복각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강노석(姜魯錫·호 가천) 씨는 올해 67세. 그는 스스로를 “건강한 중년”이라 부르며, 인생의 후반부를 전통기술과 불교 정신을 잇는 길 위에 올려놓았다.
강 씨는 남들보다 조금 이른 은퇴 후, 한옥학교 소목과정을 수료하며 창호 제작과 가구 제작을 배웠다. 현재는 경북 고령군 쌍림면 용리 502에서 공방을 운영하며, 지금도 매일 나무를 만지는 삶을 이어가고 있다. 목재와 함께해 온 세월이 어느덧 그의 일상과 신앙, 그리고 문화유산을 향한 사명감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제 그의 곁에는 또 하나의 동반자가 있다. 딸 강미숙 씨 역시 해인사 판각학교에 함께 참여하며, 아버지와 나란히 나무 앞에 앉아 칼을 들고 있다. 한 사람의 장인이 걷던 길은, 어느새 가족이 함께 이어가는 전통의 길이 되었다.
“두려움 속에서 시작된 첫 판각”
강 씨가 해인사 판각학교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고령에서 서각실을 운영하는 심강 시승부 선생의 권유였다. 서각실 회원들과 함께 문을 두드린 이 학교는, 그에게 새로운 세계이자 두려움의 시작이었다.
“세계문화유산이자 대한민국 국보인 팔만대장경을, 학교에서 배우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복각하는 교육에 참여한다는 게 지금도 가슴이 뛰고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과 설렘의 감정은 딸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강미숙 씨는 아버지와 함께 대장경 판하본을 마주하며, 단순한 기술이 아닌 ‘전통을 이어받는 책임감’을 배우고 있다고 말한다. 부녀가 함께 나무 앞에 앉아 같은 글자를 새기는 장면은, 이곳에서 흔치 않은 또 하나의 풍경이 되고 있다.
“창작이 아닌, 나를 버리는 판각”
강 씨는 서각과 판각의 가장 큰 차이를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과정’이라고 표현한다. 서각이 각자의 생각과 감각을 담아내는 창작의 영역이라면, 판각은 원본을 그대로 되살리는 복원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복각을 위한 판각은 기본 판하본의 취지를 그대로 똑같이 새겨야 합니다. 각자의 생각과 판단을 버려야 한다는 점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 가르침은 딸에게도 그대로 전해진다. 아버지는 기술을 먼저 가르치기보다, ‘겸손과 인내’를 먼저 말해준다. 강미숙 씨는 “아버지와 함께 칼을 갈며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 작업이자 대화가 된다”고 전했다.
“해인사라는 이름만으로도 웅장합니다”
팔만대장경이 자리한 해인사에서 배우는 판각은, 이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강 씨는 이 공간 자체가 이미 하나의 수행이자 교육이라고 말한다.
“팔만대장경 복원과 연구에 평생을 바쳐오신 안준영 각자장 선생님을 만나, 이 불사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이 영광의 순간을 딸과 함께 나누고 있다는 점은, 그에게 또 하나의 감사로 남는다. 전통이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가족 안에서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의로움 앞에서 다시 불교에 정진합니다”
판각 수업 이후, 강 씨의 시선은 팔만대장경을 ‘유물’이 아닌 ‘정신’으로 바라보게 됐다. 벌목, 제재, 건조, 보관, 그리고 각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제작 과정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불가사의이자 경외의 대상이다.
“훌륭한 불교의 정신에 감탄하며, 저 역시 더 정진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마음은 딸에게도 이어졌다.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 판각학교, 금강경과 반야심경이 이제는 부녀의 공통된 언어가 되었다. 칼을 갈고, 나무에 각을 하는 시간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하는 수행의 시간이 되고 있다.
“전통은 반드시 전수되어야 합니다”
강 씨는 판각 같은 전통기술이 이 시대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선조들이 남긴 문화와 풍속, 그리고 팔만대장경 제작기술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로 이어져야 할 책임이라는 것이다.
“후손과 자손들에게 계승하고 유지하기 위해, 이 기술은 반드시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의 이 말은, 딸과 함께 나무 앞에 앉아 있는 지금의 모습 자체로 이미 실천되고 있다.
함께 가는 길을 기원하며
인터뷰의 끝에서 그는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과, 무엇보다도 곁에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딸을 떠올렸다. 안준영 각자장의 세심한 가르침 아래, 모두가 이 불사의 길을 끝까지 함께 가기를 바란다는 그의 말에는 공동체적 정신과 가족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다.
나무를 만지며 살아온 한 장인의 인생은, 이제 딸과 함께 천년의 경전을 다시 새기는 손길로 이어지고 있다. 해인사 판각학교에서 만난 강노석 씨와 강미숙 씨 부녀의 이야기는, 전통이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가족을 통해 오늘에도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