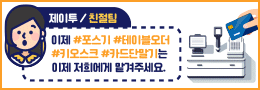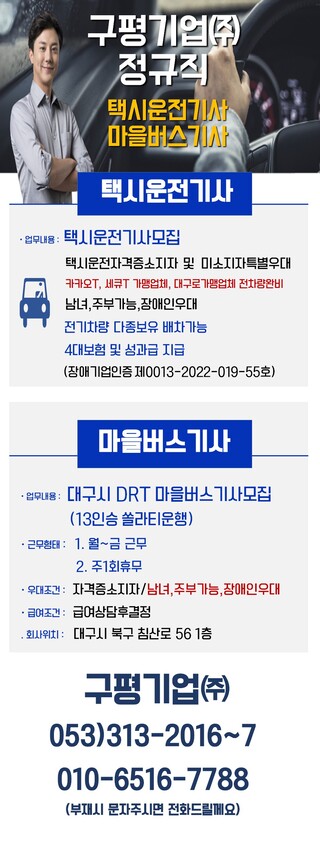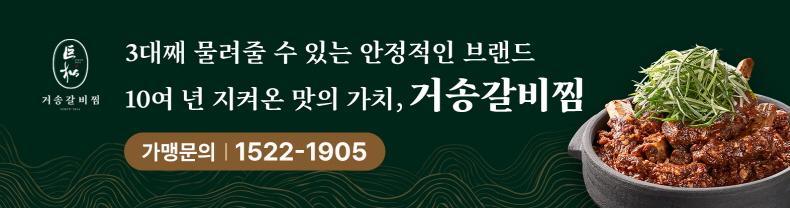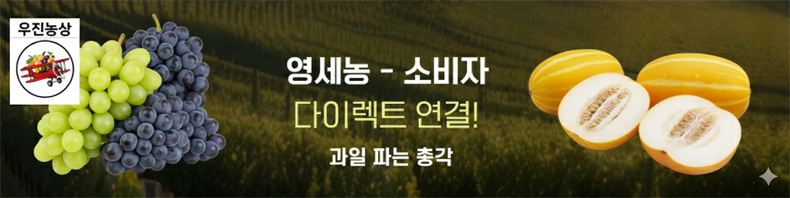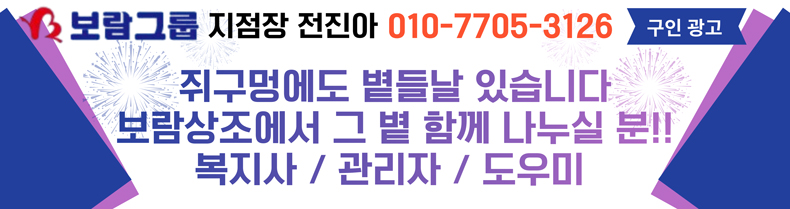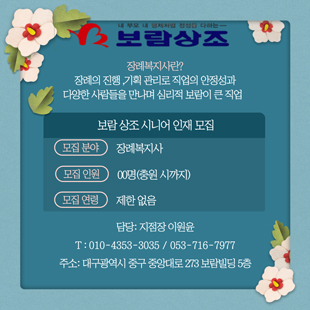가야산의 품속에 자리한 해인사는 단순한 사찰이 아니다. 이곳은 팔만대장경을 품은 경전의 성지이자, 인간의 손끝으로 만들어진 문자문화의 정수다. 그리고 그 해인사 일대에는 지금은 지도에서 사라졌지만, 여전히 사람의 구전과 기억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마을 이름이 있다. 바로 전경리(典經里)다.
‘전경리’라는 이름은 ‘경전을 맡아 다스리는 마을’이라는 뜻을 지닌것으로 보인다. ‘典’은 관리하고 보관한다는 의미를, ‘經’은 불경과 진리의 길을, ‘里’는 마을을 뜻한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경전을 관리하는 마을”이 된다. 이는 해인사가 대장경을 보관하던 사찰로서, 경판을 관리하고 정리하던 장인과 승려들의 손길이 닿았던 마을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조선 후기의 『합천읍지』나 『여지도서』 등에 ‘전경리’가 기록되었다는 전승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문헌 자료가 명확히 남아 있지 않다. 전경리라는 지명은 주로 지역 주민들의 구전과 해인사 주변의 전통 속에서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실제 역사적 기록과 지명 변천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불교에서 ‘경(經)’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진리의 길과 깨달음의 상징이다. 따라서 ‘典經’은 경전을 관리하는 행위를 넘어 진리를 지키고 전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전경리는 단순한 행정 명칭이 아닌, 해인사와 함께 불교의 정신적 뿌리를 이루던 마을이라고 볼 수 있다.
근대 이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전경리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지금은 ‘치인리’로 통합 되었으리라 예상한다. 그러나 그 이름이 품은 상징은 여전히 해인사의 역사 속에 흐르고 있다. 치인리가 ‘도장을 다스리는 마을’, 즉 새김의 중심지라면, 전경리는 ‘경전을 지키는 마을’, 진리의 중심지였을 것이다.
이 두 마을 이름이 모두 ‘새김’과 ‘진리’를 품고 있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손끝으로 새기던 판각의 예술과 마음속에 새기던 불교의 진리가 한곳에서 만났던 것이다. 현대에는 해인사 판각학교에서 판각 기술 전승이 이루어 지고 있는 이곳은 전경리라는 이름으로 비록 현재는 지도에서는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천 년의 세월을 넘어 여전히 해인사의 경전과 함께 살아 숨 쉬고 있다.
해인사를 향한 길목에서 치인리의 고요함 속에 귀 기울이면, 어쩌면 전경리의 이름이 바람결에 스쳐 들릴지도 모른다. 그것은 경전을 맡아 다스리던 사람들의 숨결이자, 진리를 새기던 시대의 기억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