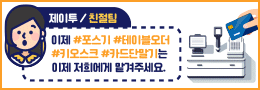-

전국 【우리가 놓친 얼굴들 4화 / 가수 전하연】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우리 함께 걷는 길에서
아이들을 처음 만난 건 봄이 오기 전, 아직은 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동두천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나들이 프로그램에 초대받아, 마주 앉게 된 친구들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따뜻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제 삶에, 그리고 제 노래에 어떤 결을 더해줄지. 처음엔 제가 뭔가 해줘야 할 것 같았어요.연예인이니까, 어른이니까, 용기를 주는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았죠.그런데 정작, 아이들과 함께 웃고, 걸으며, 간식을 나누던 그 시간 속에서 위로를 받은 쪽은 제 쪽이었습니다. 씨앗티움공동체의 아이들은 느린학습자 청소년·청년들이었습니다.세상은 그들을 기준에 맞추려 하거나, 때로는 너무 빨리 판단해버립니다.하지만 저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그 느린 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되었어요.천천히 움직이기에 더 많은 걸 보고, 더 깊게 느끼고, 더 오래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그 후로 매년 저는 그 아이들과 만났습니다.가수로서가 아니라, 언니이자 누나, 때로는 친구로서요.그렇게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나눴습니다.그리고 올해 어린이날, 저는 작은 장학금을 전했습니다.아무것도 대단한 건 아니
- 유현진 기자
- 2025-05-18 20:10
-

전국 【우리가 놓친 얼굴들 3화 / 이정신 관장】 마음의 고아원을 짓는 사람
세상에는 길을 잃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마음 둘 곳 없이 자란 아이들. 어떤 아이는 집에 있어도 외롭고, 어떤 아이는 자기를 설명할 언어조차 갖지 못한 채 어른이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복지정책도 교육개혁도 아닙니다. 먼저, 곁에 앉아줄 한 사람. 기다려줄 시간.그리고 마음이 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작은 골짜기 ‘생골’. 이곳에서 한 여인이 ‘마음의 고아원’을 짓고 있습니다. 이정신 관장, 아동문학가. 그녀는 자신이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스스로를 붙잡기 위해 기도시를 쓰며 버텼던 시간을 떠올립니다. 그 시절의 눈물은, 지금 누군가의 삶을 일으키는 글이 되었습니다. 2015년, 그녀는 아무도 눈길 주지 않던 빈 땅에 작은 문을 열었습니다. 폐버스를 고쳐 만든 ‘동화버스’, 민화를 그린 벽면, 시가 적힌 작은도서관의 벽면. 그녀가 손수 만든 이 마을은 단순한 문화공간이 아니라 치유의 흐름이 흐르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기선 동화가 상담이 되고, 벽화가 고백이 되며, 손글씨 하나가 존재의 확인이 됩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나 여기 있어도 돼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정신 관장은 생골을 ‘마음의 고
- 유현진 기자
- 2025-05-11 03:30
-
1

[인물인터뷰] 베델리엄열방센터 최미지 목사를 만나다
-
2

GTX-B노선 최대 수혜지, 마석역 바로 앞 ‘마석역 극동스타클래스 더 퍼스트’ 눈길
-
3

[인물인터뷰]695만뷰 영상의 주인공 '윤나무, 내가 대인기피증을 이겨낸 방법'
-
4

분양7번가의 OK현수막, 게릴라현수막과 인터넷 홍보시스템이 만나 분양광고시장의 새로운 장을 열다!!
-
5

[인물인터뷰]네트워크 마케팅 필독서!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 저자 : 제임스 장(James Chang)
-
6

[회사소개]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주목 받는 '파트너코', 성장 거인의 탄생
-
7

[인물인터뷰]무엇이든 물어보살 257화 대안가정 이야기... 씨앗티움 공동체 유현진 대표를 만나다.
-
8

[인물인터뷰] 해병대 정신! MZ세대 양훈엽 N잡러를 만나다. '홀로서기' 작사 작곡가 겸 펀드매니저, 인플루언서
-
9

청주시, 경로당 보조금 정산 돕는 ‘행정매니저’ 교육 실시
-
10

저는 포산 초등학교 5학년 2반 안선윤이라고 합니다!